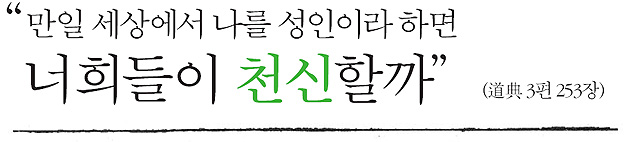 |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136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우주일년(12만 9,600년)에 단 한번 인간세상으로 행차하시는 그 절대적 시간대를 맞추기 위하여, 천상(신명계)에서는 매우 엄정하고 분주한 준비를 거쳤음을 우리는 『도전道典』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후천 가을의 금화교역하는 시운(時運)을 맞추어 하원갑(下元甲) 신미(辛未)년에 탄강하신 시간대를 보면 경오(庚午) 9월 19일에서 신미(辛未) 9월 19일까지가 384일의 황극수(皇極數)이며, 이는 정확히 13달〔354일(태음력 1년)+30일〕의 잉태기간과 일치한다. 또 어천하실 때 천지신명들이 도열한 가운데 ○○신장이 손바닥에 무엇을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탁 쳐보더니 신장들을 향하여 “아직도 시간이 멀었구나.” 하는 장면. 나○○ 신장을 찾으시는데 다른 신장이 대신 시각(時刻)을 알리다가 혼나는 광경 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도(神道)와 인사(人事)가 집행되는 엄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후천 가을의 금화교역하는 시운(時運)을 맞추어 하원갑(下元甲) 신미(辛未)년에 탄강하신 시간대를 보면 경오(庚午) 9월 19일에서 신미(辛未) 9월 19일까지가 384일의 황극수(皇極數)이며, 이는 정확히 13달〔354일(태음력 1년)+30일〕의 잉태기간과 일치한다. 또 어천하실 때 천지신명들이 도열한 가운데 ○○신장이 손바닥에 무엇을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탁 쳐보더니 신장들을 향하여 “아직도 시간이 멀었구나.” 하는 장면. 나○○ 신장을 찾으시는데 다른 신장이 대신 시각(時刻)을 알리다가 혼나는 광경 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도(神道)와 인사(人事)가 집행되는 엄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제님의 탄강과 어천 때에 뻗친 7일간 영롱한 상서기운도 모두 이를 주관하는 신명계의 봉명 모습임은 말할 것도 없다. 9년 천지공사의 도수를 맞추는 예식은 더욱 엄정하리라 생각된다. 후천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도술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인류가 더불어 감상할 때 받을 감동을 상상하면 벌써 가슴이 벅차오른다.
상제님께서 인간세상에서 행하신 희생과 봉사와 대속의 천지공사로 인하여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주무실 곳이 마땅치 않아 ‘초빈 나래를 떠들고 호연을 누이고 널 반대편에서’ 주무셨다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100여년 시간의 간격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벌어져, 말뜻도 많이 변천하였으며 또 상제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도전 3편 253장을 보면,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만일 세상에서 나를 성인이라 하면 너희들이 천신할까”라고…. 상제님께서는 1900년대 초엽 당시의 전라도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천신’이란 무슨 의미일까?
 나는 광인으로 행세하리라
나는 광인으로 행세하리라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뒤 어느 날, 당신님을 가장 오래 모셨던 김형렬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은 광인(狂人)이라는 말만 들으셨고, 우리는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김(金)씨 문중을 망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당신께서 어천하신 이후로 이것이 제일 원통하니 어찌 살꼬.”라고 울면서 탄식하였다(道典 10편 81장). 가식 없는 이 독백(獨白)에서처럼 인간세상에서 상제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상제님에 대한 세평(世評)은 그저 ‘광인(狂人)’일 뿐이었다.
기성사회가 철저하게 배타하는 가운데 상제님은 천지공사에 꼭 필요한 성도만을 골라 쓰셨다. 김형렬 성도는 천지공사장의 식주인이자 여러 구릿골 김씨들을 도문에 인도한 장본인인 만큼, 상제님의 고통이 김형렬 성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그에게 상제님께서는 “세상이 너무도 악(惡)하구나. 이 시대를 지내려면 남에게 폭을 잡히지 않아야 하느니라. 너는 광(狂)이 되지 못하니 농판으로 행세하라. 나는 광인으로 행세하리라.”라는 처세법을 내려주셨다(道典 2편 149장). 당신님이 오시지 아니면 안 되는, 한계까지 간 세상에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당신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폭잡히지 않는 완전자유인의 처세’였다.
박공우 성도식 해법 한편 상제님을 따르던 일단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였다. 태인지역 유지출신이자 상당히 부유하였던 최창조 성도 같은 분은 동네술집에서 “강탈망인지 강삿갓인지 그 강미치광이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술이나 받아 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하는 야유와 더불어 “병신 뒷다리 같은 놈들, 참말로 미친놈들은 저놈들이라.”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에 그만 흥분하고 말았다.
한편 상제님을 따르던 일단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였다. 태인지역 유지출신이자 상당히 부유하였던 최창조 성도 같은 분은 동네술집에서 “강탈망인지 강삿갓인지 그 강미치광이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술이나 받아 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하는 야유와 더불어 “병신 뒷다리 같은 놈들, 참말로 미친놈들은 저놈들이라.”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에 그만 흥분하고 말았다.
그는 혼자서 어찌할 수 없어,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돌아와 그 모욕을 털어놓아 박공우 성도의 심지에 불을 댕겼다. 정읍, 고창 등 다섯 고을의 장날이면 그 날의 모든 안녕질서를 담당하는 장치기꾼 박공우 성도가 그와 같은 발언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 즉시 장작더미로 가 몽둥이 한 개를 집어들고 목표지점을 향하여 전진 앞으로 하던 박공우 성도를 불러 멈춘 것은 잠자코 듣고 계시던 상제님이셨다. 그렇다고 곧바로 되돌아올 그가 아니었다. “공우야, 너는 오늘 나와 남이 되려느냐” 하는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박공우 성도는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道典 3편 253장).
내가 미쳤다 하기에 너희가 나를 원 없이 따른다
박공우 성도는 글을 쓸 줄 모르는 무식(無識)이었다. 길바닥에서 터득한 일상 언어 외에 그가 제대로 아는 것은 동학신도로서 외운 수운가사 뿐이었다. 그가 상제님을 처음 따르게 된 계기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수운가사의 한 구절이 전광석화처럼 뇌리를 때린 때문이었다.
그렇게 여러 성도들의 두 눈이 모두 상제님과 그 앞에 꿇어 엎드린 박공우에 집중되는 이 긴장된 순간에, 공우를 일으키며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상제님의 음성은 박공우 성도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수운가사의 한 구절로부터 시작되었다.
 |
“수운가사에 이르기를 ‘여광여취 저 양반을 따르기만 따를진대 만단설화(萬端說話)1) 한 연후에 소원성취 하련마는 못 만나서 한탄일세.’라 하였나니, 내가 미쳤다 하기에 너희가 나를 원 없이 따르게 되지, 만일 세상에서 나를 성인이라 하면 너희들이 천신할까. 모르는 가운데 정성이 깊지, 알고 난 뒤의 정성이야 누군들 못하겠냐. 깊이깊이 생각해 보라.” (道典 3편 253장 16∼18절)
이때 상제님은 ‘천신할까’라는 낯선 단어를 쓰고 계신다. 토박이 전라도말로 그 말뜻은 ‘차지할까’, ‘구경할 수 있을까’, ‘몫이 있을까’의 의미다. ‘나(상제님)’를 세상에서 성인(聖人)이라고 받들면, 과연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신다. 온 천하가 상제님의 본래 모습을 안다면, 우리가 상제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천신(薦新)’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철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의미로는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차례가 돌아와 얻을 수 있게 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의 ‘천신할까’를 요새말로 바꾸어보면 ‘(너희에게) 차례가 가겠느냐’의 뜻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신이라는 말은 어원을 파고 해석하여도 절묘하게 통하는 의미를 음미할 수 있다.

지금은 곧은 낚시의 계절
어찌 그때만 그러리요. 이는 상제님 재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호천금궐의 백보좌에서 내려와 더없이 낮은 자리에 머무셨던 상제님처럼, 당신님을 대행하시는 인사의 지도자 분들 역시 아직 진리의 위격(位格)에 부합하는 예(禮)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
태모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의 삶에 대하여 한마디로 ‘천부지(天不知)·인부지(人不知)·신부지(神不知)’로 규정해 주셨다. 하늘도, 인간도, 신명도 알지 못하는 상제님 천지공사의 도수를 집행하시는 삶을 사신다는 뜻이리라. 그러면서 ‘궁팔십 달팔십(窮八十 達八十)’의 강태공을 예를 들어 말씀해주셨다.
천하경략의 웅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때가 이르기 전까지 단지 낚시대에 그 뜻을 실어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인물. 만일 명리(名利)에 뜻이 있었다면 반드시 미끼를 걸었을 것이다. 미끼도 없고 바늘도 굽지 않았기에 걸려들 까닭이 없는 곧은낚시. 이것이 강태공 도수이다. 인고의 세월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도수. 때를 못 참고 뛰쳐나간 강태공 아내의 애절한 이야기가 성황당 전설에 남아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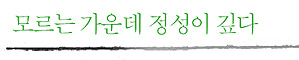
이제 바야흐로 세상사람들이 상제님을 찾아 도문으로 들어오는 시운(時運)이 도래하였다. 천지의 주인이 결정되는 상씨름 시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 그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럴수록 무신(1908)년 어느 날, 상제님께서 박공우 성도에게 화두(話頭)로 던지신 ‘너희가 천신할까’ 하신 소중한 말씀이 자꾸만 떠오른다. 모르는 가운데 정성들일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증산도 도전(道典) > [도전 탐구] 도전으로 보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상을 바꿀 발명품 10가지 (0) | 2014.11.24 |
|---|---|
| 꿈의 나노기술, 신천지 열어간다 (0) | 2014.11.24 |
| ‘유전자 혁명’시대 성큼 (0) | 2014.11.24 |
| 칠성(七星)과 칠성경(七星經) (0) | 2014.11.24 |
|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인 되는 진정한 광복의 날은 언제인가 (0) | 2014.11.24 |
| 천지의 사덕, 원형이정 (0) | 2014.11.24 |
| 천하의 난을 불러일으킨 갑오동학혁명 (0) | 2014.11.24 |
| 백년 전에 기획한 연금술의 기적 (0) | 2014.11.24 |
| 8 · 15 광복 60주년에 돌아보는 감동의 순간! (0) | 2014.11.24 |
| "병겁으로 솎아야 사(私)가 없다" (0) | 2014.11.24 |